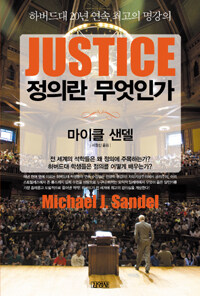반응형
베스트셀러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책이 잘 팔리는 건 이해가 가면서도 이상하다. 보통 베스트셀러는 쉬운 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이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 칸트,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들의 이론이 상당 분량을 차지한다. 범접하기 힘든 철학자/사상가들의 이론을 쉽게 설명한 것은 샌델 교수의 뛰어난 재능이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대중서로 쉽게 분류될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책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한국 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일까? 하버드의 유명 교수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분명 하버드 교수라는 이름값이 한 몫 했겠지만 한국에서 이 책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대학원 공부 모임 때문에 이 책을 읽었다. 나름대로 여러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책에 대한 토론을 했다. 여러 논쟁의 지점이 있는데 우선 이 책의 제목은 적절한가?
영어 제목은 그냥 '정의'다. 부제는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부제가 한글판의 제목과 유사점이 있지만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이름은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을 묻자는 것인지, 정의가 선험적일까 아니면 경험적일까 물어보는 것인지 애매하다.
나름대로 저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정의는 완전히 선험적이지도 그렇다고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두리뭉실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저자는 1980년대 롤스의 정의론에 이의를 제기한 '공동체주의자'의 한 명으로서 공동체에서 부과한 도덕과 정의를 개인들이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책의 많은 부분에서 공동체주의가 비판하고 나선 자유주의의 입장이 옳은 부분이 많다는데 수긍하고 있다.
책의 대부분이 사례를 통한 고민거리 던지기의 방식으로 서술되었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책 후반부이다. 과거사 반성을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속 세대들이 해야하는가라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후손들이 대신 사과하는 것은 아름답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과거의 잘못까지 사과해야하나?
공동체라는 것이 고정적이어야 과거사에 대한 후손들의 사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과 조선 시대 한국은 같지 않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같지 않다. 국가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버렸는데, 심지어 어떤 국가는 소멸되고 민족이 와해되었는데 어떤 사과를 하란 말인가.
공동체주의의 약점의 하나는 국가가 공동체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민족국가에 대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유명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뒤집어 보면 상상의 공동체는 사실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공동체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말할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최상위의 공동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과연 미국이 공동체인가? 폴리스와는 너무 괴리가 있는 단위의 정치체이지 않은가.
정의와 관련하여 궁극의 문제는 이것이다. 기독교가 지배한 서구에서 정의는 신이 정하는 바였다. 그러나 신을 배제하고 인간이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정의의 입지는 아주 취약해졌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근대 서구의 사상가들은 그렇다고 쇄뇌와 자기암시를 했다. 마침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 정의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도 신이라는 절대적 근거가 없는 상태의 인간의 이성이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누구나 느끼게 된다. 요즘 한국 사회를 봐도 짐승 같은 인간들의 뉴스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간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인간의 존재는 결코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간이 특별히 여러 생명체 중 우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의 이성, 존엄성을 상정하지 않는 인간 사회에는 어떤 혼란이 닥칠지 모른다.
신이 없기에 인간이 질서를 만들어나간다면 두 가지 생각이 작동한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따라야 할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규범이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고 상황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상충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지만 머릿 속의 논리만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가자면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말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자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자유지상주의를 경계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처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분명 재미있게 읽었고 매우 유익했으나 이 논의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유의미하게 수용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반응형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르센 벵거" by 톰 올드필드 (0) | 2010.12.13 |
|---|---|
| 코난 도일, 배스커빌 가문의 하운드 (0) | 2010.07.25 |
| 신봉승 - 문묘18현 (청아출판사) (0) | 2010.07.09 |
| 무라카미 하루키 - 노르웨이의 숲/상실의 시대 (0) | 2010.07.05 |
| 쿡 북카페는 미래다 (0) | 2010.05.24 |